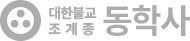고통을 마주할 용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4.21 조회396회 댓글0건본문
제목: 고통을 마주할 용기
치문반 성우
출가 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이고 허무했습니다. 나는 무얼 하기 위해 태어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다 불교 법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인간이나 동물, 식물 하물며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현실의 인생이 고(苦)인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래는 프란시스 스토리가 지은 불교의 초석 사성제라는 책에서 따온 인용구입니다.
비구들이여!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태어남이 고다. 노쇠가 고다. 죽음이 고다.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고다. 즐거운 것과 갈라짐이 고요, 싫은 것과 같이함이 또한 고다. 요컨대 집착과 연관된 존재의 다섯 쌓임(五取蘊)이 바로 고다.
제가 그동안 대중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사성제와 팔정도에 적용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라 설법이 아닌 제가 느낀 것들을 대중스님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가를 결심하고 더 이상의 큰 고통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큰 갈애와 집착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막내 일을 맡게 되었고 그것들을 더욱 잘해 내고 싶은 마음이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팠던 발목과 무릎이 말썽이었고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를 않자 답답한 마음에 도반들과 대중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망과 비교, 불안이 스스로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출가했던 저인데 다시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고통의 원인인 갈애와 집착에 대한 자각, 즉 집성제를 간접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이 지속되는 건 외부 환경 탓이 아닌 내 집착과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한다 생각을 전환했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집착을 없애고 고통을 소멸하는 멸성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과 실천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나가는 도성제를 몸소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첫째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수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상판 스님들이 한마디씩 조언해 주는 것은 모두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받아들이고 걱정이 아닌 배움의 자세로 임했더니 경직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둘째, 정사유 즉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도반들이나 상판 스님들이 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가 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체생활에서 울력도 하고 발우공양도 하고 예불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대중과 화합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양한 생활 예절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정어 즉 험담하지 않고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사소한 말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가려 해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말이 많지 않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어 한 번 화가 나면 거친 말들을 내뱉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박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말을 내뱉기 전에 거듭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여 의욕을 북돋아 주고 나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넷째, 정업 즉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강원에 와서 인상 깊었던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염불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벌레를 잡아 아프지 않게 놓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축생의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길가에 한 그루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느끼는 고통이 다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행함으로써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 즉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옛 스님들은 탁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시줏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시줏물을 과하게 탐하거나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것도 수행자의 청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 즉, 바른 노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 계발 마음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자신과 타협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강원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도반이 의견을 공유할 때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을 느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째, 정념 즉 바른 마음챙김 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걸을 줄 알고 먹을 때 먹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곤 합니다. 저 역시 막내 역할이 익숙지 않아서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실수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음 일정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것을 다시 안 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상황을 온전히 즐기려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정정 즉 바른 집중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로 집중하는 것으로 명상하거나 호흡하고 산책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저는 명상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수업 전에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들뜬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선정수행에 대해 더 공부해서 나만의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진리를 저의 대중 생활에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과 비교 심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대중들과 화합하는 방법을 습득해서 강원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